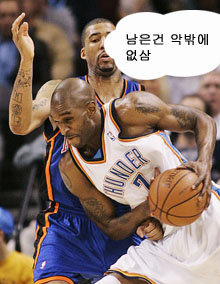NBA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지났다. 클리블랜드는 마지막까지 논의됐던 샤킬 오닐 영입을 포기하면서, 주전 5명 중 3명을 바꿨던 작년과는 달리 어떤 트레이드도 하지 않은 채 후반기에 임하게 됐다. 아무 것도 얻지 않은 대신 아무 것도 잃지 않은 것이다.
클리블랜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루머 중 어제 마지막까지 논의되던 것은 뜻밖에도 오닐을 데려오는 딜이었다. 클리블랜드에서 벤 월러스와 사샤 파블로비치를 보내고 피닉스에서 오닐을 데려오는 딜이었다. 그런데 피닉스에서 저비악, 파블로비치와 J.J. 힉슨 또는 1라운드픽을 제시했고, 클리블랜드 측에서 제3의 팀을 끌어들여보려 했지만 실패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 딜에 대해 필자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협상과정을 통해 클리블랜드 프런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아무리 클리블랜드라도 무한정으로 돈을 쓸 수 있는 팀은 아니다.
클리브랜드의 현재 총연봉은 약 9,000만 달러로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다. 세계 경제 침체로 리그 전체에 불고 있는 비용 감축 바람은 클리블랜드도 예외가 아니다. 게다가 클리블랜드의 구단주 댄 길버트의 주력 회사인 퀴큰 론즈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회사다. 구단마다 당장 내년 총연봉을 줄이려 안간힘을 쓰는 바람에 만기계약자의 가치가 이례적으로 뛰어올랐지만, 만기계약자가 아쉬운 것은 클리블랜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클리블랜드에서 월러스를 제시했는데 피닉스가 월러스 대신 저비악을 원했다는 건 피닉스가 내년에 계약이 끝나는 선수보다는 당장 올해 계약이 끝나는 선수를 원했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클리블랜드는 저비악 트레이드를 거부했다. 이것은 월러스의 선수로서의 가치가 저비악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클리블랜드 역시 올해 계약이 끝나는 선수가 필요했다는 뜻이다. 사실 파블로비치 역시 내년 만기연봉 490만 달러 중 보장되어 있는 것은 180만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기카드로 봐도 되는데, 클리블랜드는 만기 카드 두 장의 가치가 오닐보다 크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는 올해 7.3밀의 만기계약자인 스노우의 이름이 이 딜에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스노우의 계약은 부상으로 인한 은퇴가 확정될 경우 대부분을 보험처리할 수 있는 '슈퍼 만기 계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클리블랜드는 이 카드를 쓸 생각을 하지 않았다.
클리블랜드가 내년 저비악과 스노우의 연봉 2,000만 달러가 빠지더라도 샐러리캡이 넘음을 들어 어차피 FA를 영입할 수 없을 바에는 이번에 누군가를 데려와야 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런데 클리블랜드는 지금 FA 영입에 신경쓸 여유가 없다. 이번 시즌이 끝나고 옵트아웃이 확실시되는 바레장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국 경제가 어렵더라도, 바레장의 에이전트인 댄 페건은 최소한 1,000만 달러는 부르고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클리블랜드로써는 바레장을 잡기 위한 자금을 아껴놓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클리블랜드는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전력을 보강하기보다는 그 여력으로 현 전력을 보존하는 길을 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클리블랜드는 힉슨을 트레이드하고 싶지 않았다.
클리블랜드의 최대 강점 중 하나는 벤치에서 나오는 바레장으로, 바레장은 클리블랜드가 보드 장악력과 수비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요인 중 하나다. 그런데 바레장이 이번 시즌 종료 후 클리블랜드와 장기계약을 맺으면, 빠르면 다음 시즌, 늦어도 그 다음 시즌에는 주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주전인 지드루나스 일가우스카스와 월러스 모두 고령이고 2010년에 계약이 끝나는데다가 1,000만 달러 내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레장을 벤치에서 내보내긴 아깝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벤치에서 지금의 바레장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힉슨 뿐이다.
페리 단장은 르브론과 재계약한 재작년부터 2010년을 계획해온 사람이다. 그런 페리에게 2010년 이후 골밑을 책임져줄 수 있는 힉슨은 쉽게 버릴 수 없는 카드였을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점이지만, 페리를 비롯한 클리블랜드 팀 전체가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 소극적이었다.
데드라인 종료 후 페리가 한 말이 현재 클리블랜드가 트레이드에 대해 느끼는 바를 가장 잘 표현해준다.
"We felt no pressure to make changes."
실제로 페리나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나 선수들이나 트레이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난 수개월간 저비악 만기카드를 둘러싸고 나온 루머는 거의 모두가 상대팀에게서 나온 것이었고, 브라운 감독이야 원래 트레이드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 둘째치더라도 선수들중 트레이드를 원하는 선수는 한명도 없었다.
작년 이맘때를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팀의 모든 구성원이 트레이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모두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래리 휴즈패키지‘, 좋지 않은 팀 캐미스트리, 키드 영입을 강력히 워한 르브론 등, 뭔가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팀 구성원 모두가 자신감에 차있고 실제로 성적도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승률을 달리고 있다. 브라운 감독의 전술은 클리블랜드에 온전히 뿌리내렸고 선수들은 서로를 좋아한다. 팀의 알파요 오메가인 르브론은 '현재 팀에 만족한다'며 거듭거듭 만족을 표하고 있다. 과연 이런 팀을 깰 만큼 강심장인 GM이 리그에 몇이나 있을까? 아무리 팀 전력을 높여줄 수 있는 트레이드라도 그것이 팀 캐미스트리를 깰 경우 좋은 결과를 내긴 힘들다. 따라서 페리가 트레이드 시장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하기에는 처음부터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렇다면 데드라인 이전 며칠간 페리가 보인 수많은 움직임은 무엇인가? 필자는 그것들이 전형적인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 류의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페리가 제시한 딜들을 보면 정말 딜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황당한 찔러보기가 많았다. 전혀 페리답지 않은 제안들이었다. 페리는 트레이드 데드라인 몇 달 전에는 황당한 얘길 많이 하지만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며칠 앞두고는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막판까지 황당한 딜을 계속 제시했다는 건 애시당초 별로 성의가 없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몇 달 전 페리 단장 자신이 직접 한 말이 있다. 제랄드 월러스 영입 얘기가 막 나올 무렵이었는데, 당시 페리는 시즌 중 트레이드에 대해 '맥시멈급 젊은 슈퍼스타를 데려올 수 있으면 모르되 아니면 별로 움직일 마음이 없다'고 한 적이 있다. 이번 ‘노 딜’은 그 마인드가 데드라인까지 그대로 이어진 것일 뿐이다.
따라서, 애시당초 페리는 팀에 재정압박을 주면서까지 무리수를 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클리블랜드의 전력 보강은 이걸로 끝인가? 필자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클리블랜드에는 아직 FA 영입이란 한 수가 남아있다. 특히 빅맨 물량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 움직임이 있을 걸로 생각된다.
클리블랜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익셉션은 총 510만 달러에 달한다. 스미스가 올시즌 받고 있는 480만 달러보다도 많으며 플레이오프 상위시드권 팀들 중에서는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와 함께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 특히 유력한 경쟁팀인 보스턴보다는 쓸 수 있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최근 스미스의 목적지로 거론되던 보스턴 셀틱스는 마이키 무어와 스테판 마버리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끝냈다. 또한 스미스는 두달 전까지만 해도 'FA가 되면 클리블랜드에서 뛰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510만 달러는 스미스를 데려오기에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다.
스미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카드는 로버트 오리와 크리스 밈이다. 플레이오프에서 수많은 빅샷을 터뜨려 ‘빅샷 랍’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오리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뛴 지난 시즌 이후 한 경기도 뛰지 않고 있다. 파워포워드와 센터를 볼 수 있는 오리가 클리블랜드에 가세한다면 마지막 순간 가동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 오리는 샌안토니오 시절 한솥밥을 먹은 페리 단장 및 마이크 브라운 감독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밈은 7피트의 신장을 바탕으로 골밑 수비가 가능하며, 파이널에서 만날 수도 있는 레이커스에서 최근까지 뛰었기 때문에 경기 감각도 살아있는 상태다. 밈은 르브론의 프로 초창기 시절 클리블랜드에서 함께 뛴 경험도 있다.
이번주까지 방출된 선수는 FA 계약 후에도 플레이오프에서 뛸 수 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의 움직임은 좀더 두고봐야 할 전망이다.
필자는 오닐을 데려오는 것이 클리블랜드의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 생각했다. 일가우스카스와 포지션이 겹치며 2:2 수비에 약점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닐 루머가 돌기 시작한 이후로 오닐이 르브론과 함께 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데드라인 전날 잠을 이루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2000년대를 대표하는 선수이며 페니 하더웨이, 코비 브라이언트, 드웨인 웨이드 등 당대 최고 스윙맨과 호흡을 맞춰온 오닐이 2010년대를 대표할 르브론과 함께 커리어 마지막 우승을 일궈내는 모습, 애증의 대상인 코비와 2000년대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던컨과의 마지막 승부..... NBA 팬이라면 누구든 떠올렸음직한 즐거운 상상이다.
하지만 오닐은 클리블랜드로 오지 않았고, 앞으로 올 가능성도 사라졌다. 클리블랜드는 새로운 전력 보강 없이 후반기에 임하게 됐지만, 주전 슈팅가드 딜론테 웨스트를 비롯한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게 되면 최고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NBA 파이널까지 약 4개월, 르브론이 생애 두 번째 도전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된다면 클리블랜드의 ‘노 딜’은 팬들게서 옳은 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뛰어(www.ddueh.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9/02/21 - 피닉스 선즈 스타더마이어, 8주 못뛴다
2009/02/20 - 한 눈에 보는 오늘의 NBA
2009/02/20 - ‘희생’ 의 미학 - 1972년 레이커스의 33연승 신화
2009/02/19 - 한 눈에 보는 오늘의 NBA
'NEWS & COLUMNS > HELTANT79'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마이클 조던의 작은 선행 (3) | 2009.04.08 |
|---|---|
| 두 번째 기적을 꿈꾸는 오스틴 카 (0) | 2009.03.11 |
| 신뢰의 리더십: 마이크 브라운의 '성공의 법칙' (1) | 2009.02.04 |
|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2008년 10대 뉴스 (0) | 2008.12.29 |